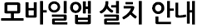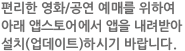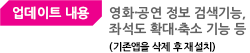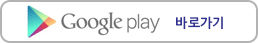영화평론가 비평
| 서머 스페셜 2018 <포이즌> |
|---|

<포이즌> - 오늘날 중독의 위기는 독이 좀 빠져버린 데 있는 것 같다.
김영광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중독은 위험한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 신세기에는 다른 양상인 듯하다. 게임, 쇼핑, 여행, 맛집, SNS 어디에나 붙는다. 때론 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고 맛집을 들른 후 SNS에 올리는 일이 연쇄된다. 하루를 최고의 플레이로 ‘Clear’ 하려는 게임처럼 말이다. 사실 순서는 중요치 않다. 요즘 중독은 무슨 욕망이 선행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선행이 핵심도 아니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다. 반면에 중독에 가까운 위험한 욕망이란 게 있는 건지도 아리송하다. 실제로 자신의 중독 증세를 고백하는 이들 중 지독한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중독을 커밍아웃하는 일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위로와 위안이 담보된 유희처럼 행한다. 이상한 말이지만 오늘날 중독이 처한 위기는 독이 좀 빠져버린 데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샤 기트리의 <포이즌>(1951)이 오늘날 독 빠진 중독 현상을 다룬 영화인지 장담할 순 없다. 다만 중독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다룬 낌새 같은 작품이다. 그 낌새가 영화보다 연극을 사랑한 이 감독의 특색과 어울리며 어렴풋한 추측을 낳는다고 할 순 있다. <포이즌>은 감독 기트리가 이후 직접 출연할 배우들에게 찬사를 바치는 일로 시작된다. 영화의 사건은 기트리에게 연기와 실제를 구분치 못하는 미덕으로 극찬을 받은 폴이 알콜 중독에 빠진 아내를 살해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전부이다. 여기서 관객이 처하는 위기는 기트리가 시작부터 쳐놓은 ‘세이프 라인(이건 영화일 뿐이야)’ 덕분에 영화를 감정적으로 즐길 수 없다는 게 아니다. <포이즌>은 사건 과정에서 아이러니가 연쇄로 발생하고 그 상황들은 웃음을 참기 힘들다. 또한 그 상황들은 한 사회의 규범과 의무로서 신성시되는 법률, 종교, 공동체 의식을 ‘싸잡아’ 비판한 지점들이기도 하다. 그렇다. 문제는 ‘분별없음’, <포이즌>에서 관객이 처하는 위기는 감정적 포인트가 정작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느껴질 수 없음’에서 발생한다.
<포이즌>은 무죄를 받은 폴이 마을로 귀환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끝이 난다. 마을 사람들은 “용서 받았어!” 외치며 감동스러워하지만 감동의 포인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같은 말이지만 비판의 포인트도 오리무중이다. 폴이 법률로부터 용서(?)받더라도 종교와 도덕의 문제는 남는 것이다. 헌데 마을 공동체는 살인 사건 직후와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눈앞의 상황에 몰입하여 활기를 보일 뿐, 한때 구성원의 죽음에 애도하는 이는 ‘1’도 없다. 정확히는 폴이 살해한 아내의 죽음이 기쁨(!)으로도 의식되지 않는 상태로서 ‘건강함’을 보이는 것이다. 저 감정적 상태는 위험한 것일까? 아니, 건강함은 감정적 상태가 아니다. 이 결말의 상태가 보여주고 있는 건 (감동 혹은 비판 같은) 감정적 포인트의 향방이 느껴질 수 없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평면성’에 다름 아니다. 기트리가 시작점에 쳐놓은 ‘세이프 라인’의 효과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포이즌>에서 관객이 처하는 위기의 정체는 영화 과정에서 즐긴 감정적 포인트가 하나의 ‘증세’에 불과하다는 낌새, 관객의 자리가 하나의 영화적인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안전함’인 것이다(앞서 ‘소격효과’라고 불러도 좋을 시작점을 굳이 ‘세이프 라인’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그것이다).
기트리가 <포이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관객 비판이나 모두의 책임론 따위가 아니다. 도리어 영화라는 매체가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중이다. 우리는 영화에 빠져 감동받는 이들도, 비판적 거리를 지켰으나 감동을 받았다는 이들도 재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안다. ‘관객 모독’을 하기 위해선 중독에 가까운 지독한 몰입이 선행 조건이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영화를, 어떨 땐 중독된 듯 한 편의 영화를 반복해서보지만 금세 ‘건강한’ 삶을 되찾는다. 반대로 영화를 냉소하는 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영화라는 대중적 관심사는 놓지 못한다. 어떤 증세마냥 이따금씩 영화를 주시하는 것이다. 기트리가 보기에 그런 결과적 양상을 가진 영화는 지독한 (감동 혹은 비판 같은) ‘감정적 동요’를 수행할 수 없는 매체다. 그러니 영화에 중독된다든가 영화 중독의 위험성을 비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기술인 셈이다. 그것도 실소할 만큼 ‘안전한’ 사기술 말이다. 적어도 기트리에겐, <어느 사기꾼의 이야기>(1936)에서 영화란 결국 사기술과 같다는 위험한 고백이 전에 없던 상찬으로 돌아왔으니 무리도 아닐 것이다.
<포이즌>은 기트리가 영화적이지 않다고 비판받던 연극적인 부분, 그 평면성으로부터 ‘안전함’과 ‘건강함’만 남은 영화의 존재론을 조소한 작품이다. 영화에서 지독한 중독에 빠진 존재만 퇴장하는 부분처럼, 그렇게 남은 건 독 빠진 중독 증세의 존재들이라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포이즌>은 전에 없던 ‘Clean'한 감상 방식을 요구한다. 영화에 지독히 중독된 사람과 아무 것에도 중독된 낌새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곤, 한 번 보고나면 미련 없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독 빠진 중독 증세를 달고 사는 한 더도 덜도 말고 두 번 보아서는 안 되는 작품이 <포이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