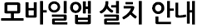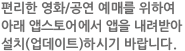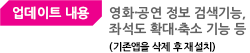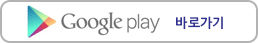영화평론가 비평
| 앙드레 바쟁이 사랑한 영화들 <파르비크> |
|---|

조르주 루키에의 <파르비크Farrebique>(1946)
계절이 진다는 것
장지욱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영화로서 프랑스를 본다는 것. 정작 가보지 않았어도 어렵지 않게 상상하고 잘 알지 못하는 ‘누벨바그’라는 단어를 입 안에서 굴려보며 그 물결이 낳은 감독과 영화, 그들이 낳은 공간을 동경하다 친숙해 지는 것. 익숙하다 할 수는 없지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 불뚝 솟은 에펠탑을 말하기 보다는 담배 연기 자욱한 어느 흑백의 바에 들어가 와인 대신 싸구려 맥주를 마시다가 먼저 취한 손님의 탭댄스를 보았노라 말하고 싶은 곳. 영화로서 프랑스를 본다는 것은 프랑스라는 이름의 파리를 보는 것이며 도시를 보는 일이며 파리지앵의 삶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언젠가는 나 역시도 그곳으로 내려앉아 ‘젊음과 충동과 자유로움이라는 선입견에 관대해져 버린 나를 발견하리라’ 기약하고 희망하는, 허세 충만해지는 일이다. 여전히 가보지 못해서일까. 이렇듯 선입견에 반쪽 눈이 되어버린 내게, 혹은 나와 같은 이들에게 조르주 루키에의 <파르비크>가 인도하는 곳은 차라리 프랑스가 아니라 해도 무방하다. 배경은 파리가 아니고 도시도 아닌 어느 농촌 마을. 촌스러운 고백을 먼저 하자면 이 영화의 첫 십 분을 본 감상은 이렇다. 프랑스 영화에 시골이라니!
조르주 루키에는 1946년에 프랑스 아베롱의 구트렝(Gourtrens)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를 내놓았다. 1년 동안 이 마을의 어느 농가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삶의 반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흑백의 화면은 시골 풍경이 가득 매우고 영화의 소리는 사람들의 대소사로 수다스럽게 채워진다. 이제 이 영화를 본 십 분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다큐멘터리라 불리는 <파르비크>는 지금 극장에서 만나는 부류와는 다소 이질적이다. 특히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마주하면서 그 감독의 의도된 촬영은 두드러진다.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큰 차이를 인물 간의 대화법에서 떠올릴 수 있다. 극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우끼리 주고받는 쇼트들, ‘너’와 ‘나’ ‘우리’(A클로즈업-B클로즈업-A와 B의 마주보는 쇼트)와 같은 순열은 다큐멘터리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되도록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의 특성상 현장에서 실제 나누는 대화를 극영화처럼 기술적으로 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작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보이는 이러한 장면은 실은 <파르비크>에 국한된 개성이라기보다는 플래허티로부터 출발해 <파르비크>를 비롯한 40년대의 다큐멘터리 작품에게 드리워졌던 담론의 영역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당시의 담론을, 즉 다큐멘터리의 태동에서 발현되는 양식과 시도를 마주하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다. 어쨌거나 가족이 모여 지정된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극영화의 그것과 닮았다. 말을 던지고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표정하는. 이후 시네마 베리테와 다이렉트 시네마 등의 영화 운동을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 다큐멘터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그것과 점점 닮아 가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이번 지면에서는 줄이기로 한다. 다시 <파르비크>로 돌아가서 조르주 루키에가 일련의 시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다큐멘터리라는, 혹은 지금에서 비교하자면 명확하게 다큐멘터리라고 정의하기 모호했을 새로운 무언가를 표현해 내고자 한 것이다. <파르비크>는 피사체나 사건의 포착에 머무르는 뉴스릴이나 소설에 의지하여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서사 기반의 극영화의 틈을 비집고 나아가고자 한다. 그 결과로서 <파르비크>가 드러내는 이미지는 사람과 집이, 공동체와 자연이 조우하게 만드는 시적 편집이며 그 시도의 구심은 시간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감흥은 영화로서 프랑스를 바라보며 떠올린 도시 이미지에 대한 반쪽짜리 상상이 촌스럽다 여겨진 순간이라는 것을 새삼 두 번째 고백에 붙인다.
<파르비크>의 계절은 흘러가는 시간을 집약한다. 그 시간은 울타리 그림자가 한 나절 만큼 늘어나고 나뭇가지의 잎이 피고 지면서 계절을 그리고 논과 밭이 변모하는 신들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이 자연의 몫이라면 흐름을 관장하는 것은 변모하는 자연의 단위마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농민들의 손과 몸이다. 이들은 매시 먹고 일하고 모이고 대화한다. 한 계절은 먹을 만큼의 반죽을 하면 반죽은 익어 빵이 된다. 그 시간을 쪼개어 매시 가축에게 끼니를 먹이고 논과 밭으로 나가 일을 하며 때가 되면 갈라진 벽을 보수한다. 반복해서 보여주는 마을 사람들의 노동의 쇼트들이 쌓여서 충만해 질 즈음에 계절이라는 단위가 된다. 뒤집어 생각하면 계절은 모여서 공동체의 삶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가족 중 한 사내는 늘 쓰는 칼을 꺼내 빵 덩어리를 자르고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한결같은 그의 행위로 가족의 식탁은 짧게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고 계절을 지나면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마중 길과 인생을 마감한 가족의 배웅길이 되어준다. <파르비크>에서 계절이 진다는 것은 거대한 시간의 덩어리를 단위로 때어내어 나누어주는 일이며 그 단위는 한 끼와 하루와 한 계절이 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저물고 집은 낡아가는 순리의 단위, 공동체가 자연과 살아가는 과정의 단위이다.
<파르비크>에서 조르주 루키에의 시도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한 단위를 구분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의미는 관객을 향한다. 밤이면 불이 켜지는 파리 대신 그가 구트렝으로 간 이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전문 배우 대신 나무와 농민을 선택한 이유, 허구의 서사 대신 반복되는 행위를 선택한 이유는 계절이 진다는 것, 그리고 다시 또 시작된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의지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무의미한 전쟁이 두 번 지나간 시점에서 조르주 루키에는 지는 한 계절을 그렸고 오는 한 계절을 응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