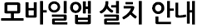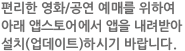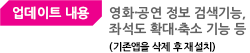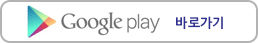영화평론가 비평
| 독일 영화의 봄 <도둑> |
|---|

달리기와 강도, 그리고 영화가 스크린을 넘어 올 때 <도둑>(벤야민 하이젠베르크, 2010)
구형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스크린의 안과 밖
막 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요한(안드레아스 루스트)은 좁고 불편한 방을 구한다. 경비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시설에 대한 퉁명스러운 안내를 받은 후, 짐을 정리하던 요한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면 창밖으로 기차가 지나간다. 이어지는 숏에서 카메라는 기차의 안에 있다. 요한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이내 차를 훔치고 은행 강도를 저지른다. 이 장면을 이렇게 한 번 말해보자. 교도소의 방보다 딱히 더 나을 것 없어 보이는 작은 방(현실)에 있던 요한은 창문(스크린)을 바라본다. 그리고 창문(스크린) 속에 있던 기차로 들어간다. 말하자면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스크린 속, 즉 영화 속에서 종종 일어나곤 하는 일을 행한다. 바로 은행 강도이다. 요컨대 요한은 스크린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크린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요한이 에리카(프란치즈카 바이즈)와 영화를 보러 갔을 때를 상기해보자. 정확히 어떤 영화를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화면에서 들리는 소리로 추정하건데 그들은 자동차가 폭발하고, 쫓고 쫓기는 카체이싱 장르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미묘한 표정으로 영화를 보고나온 요한은 꽉 막힌 도로 사이에 주차된 차를 보행자들이 다니는 공원을 가로지르며 몰고 간다. 요한의 이러한 마구잡이식 운전이, 바로 직전에 그들이 보던 영화 속 카체이싱으로 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상상일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은 극장을 나서서 현실로 돌아왔으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그 스크린 속 카체이싱 장면 속에 들어가 있다. 말하자면 그는 스크린과 현실의 경계가 지워진 인물인 것이다. 여기에는 스크린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가늠코자 하는 영화적 실천이 있다. 앞서 언급한, 창문을 바라보고 바로 다음 숏에서 인물이 창문 속으로 들어가는 숏의 구성은, 창문(스크린)의 경계를 넘나드는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스크린이라는 물질적 단면이 영화와 현실 사이를 경계 짓는 단절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임을 환유한다. 말하자면 영화와 현실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과 언어를 통해 상호 교류하고 영향 받는 세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현실과 스크린의 (깊은)사이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세계의 상호 교류는 동시에 존재론적 혼란을 수반하기도 한다. 가령 요한은 스크린 속에서 짜릿하고 환상적인, 즉 장르적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해 모종의 허무함을 겪어 계속 방황하는 실재의 인물이다. 요한은 끊임없이 달린다. 그는 가면을 쓴 은행 강도이자, 마라톤 영웅이고, 용의주도하게 경찰을 따돌리는 도주범이며, 총과 돈과 섹스로 둘러싸인, 다분히 범죄영화적 인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요한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는 연애와 섹스 후에도 진정한 신뢰나 관계를 쌓지 못하고,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해 명예와 상금을 얻고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정착을 이야기하는 교도관을 살해하고, 끝없는 은행 강도와 달리기 속에서도 실존적인 공허로 인해 외로워하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화와 현실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과 조화, 나아가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공허함과 소외가 있다. 요한의 내면에는 영화와 현실 사이에, 스크린의 경계에 존재하는 연결과 단절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으며, 그것이 요한의 무표정한 얼굴 이면에서 불안하게 바스라질듯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요한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현실의 삶은 은행 강도라는, 자극적이지만 단순한 사건만으로는 온전히 완성될 수 없으며, 반대로 관습으로 이루어진 장르적 인물에게 실존적 공허함이란, 그 자체로 주체와 세계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질문이 되기 때문이다.
장르의 붕괴, 혹은 확장
그리고 스크린의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파생되는 괴리는 죽음을 감지하면서 조금씩 좁아진다. 경찰서에서 탈출한 요한은 이제 은행 강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달린다. 가면을 벗고, (가슴에 차던)기록을 측정하는 기계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달리고, 타인을 협박하고, 차를 강탈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존적 괴리나 공허 대신 끈질긴 생(生)에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운동만이 있을 뿐이다. 즉, 장르로서 영화적 활동과 그 바깥에 실재하는 삶의 혼란이 생(生)이라는 원초적인 욕구를 통해 이윽고 하나로 겹쳐진다. 요한은 그 어떤 때보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서 숨이 차도록 달리고, 차를 빼앗고, 도망친다. 그는 여전히 스크린 속 장르적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의 실존적 고뇌 또한 그가 달리는 장르적 도주극 속에서 해소된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은 비로소 스크린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그 외부와의 괴리를 해결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 하지만 영화는 그 해답 앞에서 멈춰 선다. 이제야 뚜렷하게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요한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칼에 찔린 곳에서 피를 흘리며 가파르게 숨을 쉬고는 결국, (어쩌면 운명적으로)죽음을 맞이한다.
장르 영화는 그 견고한 세계의 토대만큼이나 폐쇄적으로 스크린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뚜렷이 했고, 우리는 그 경계 바깥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스크린 속 인물들을 소비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영화가 관객과 관계 맺어온 방식이기도하다. 그러나 요한이 스크린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며 실존적 혼란을 겪음으로서, <도둑>은 이제 영화가 더 직접적으로 세계의 존재와 삶에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나아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이제 여기서 죽은 것은 누구일까. 어디까지나 영화 속 (장르적)악당이 죽은 것일 뿐일까. 아니면 세계에 현존하며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는 한 인간이 죽은 것일까. 요한의 죽음의 기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을까. 요한의 이야기가 실존 인물에 기반했다는 점은 비로소 여기에 이르러 의미심장해진다. 요한은 그렇게 스크린의 경계를 넘어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